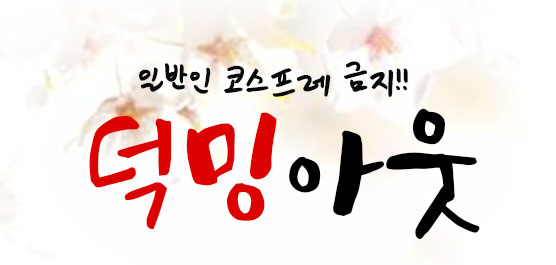사주 해석과 주화입마
며칠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분의 블로그 글을 우연히 읽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몇자 끄적여 볼까 합니다.
그 글의 요점은 어떤 학문이나 주화입마의 단계라고 부를수 있는 단계가 있으며 그 단계를 이겨내야만 참다운 경지(?)에 이를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역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자기가 하는 풀이들이 아주 잘 맞아서 자기 만의 해법이나 풀이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의 해법이나 풀이 방식은 다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주화입마의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자기만의 해법이나 풀이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의 풀이는 다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의 수학문제를 푸는데 있어 해법은 여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대수적인 관점으로 풀이할수도 있고 기하학을 이용해서 풀이할수도 있습니다. 한 이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귀납적인 풀이도 있을수가 있고 연역적인 풀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고등학교 시절의 수학시간에 미적분학을 처음 배우면서 그 당시 수학 선생님이 들려주신 한가지 비유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어떤 수학자가 어느날 이상하고 기묘하게 생긴 물병의 내부 용적을 구하라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냈다고 합니다. 한 제자는 그 물병의 용적을 편미분을 이용해서 아주 복잡하게 계산해서 정답을 내었고, 다른 한 제자는 그 물병에 물을 부어서 그 물병에 담겨지는 물의 양으로 물병의 내부 용적을 간단히 계산해 내었다고 합니다. 즉 생각의 전환에 의해서 한가지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미두수를 포함한 여러가지 역술들의 풀이에도 여러가지 해법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가 복잡하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풀이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저의 잡담에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캄은 면도날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은 간단한 것일 수록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가지 다양성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역술과 학설들 그리고 여러가지 독특한 해법들이 존재하기에 이 세상이 더 재미있고 개인적으로 흥분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리학이나 자미두수의 해법에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간법은 다 틀리고 자기만의 방식만이 옳다거나 하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오캄의 면도날에 대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의 패러다임에서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캄의 면도날은 톡톡히 역할을 하였다. 당시 행성은 프톨레이아오스의 천동설만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운동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천동설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전해내려온 오래된 믿음, 행성은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한다는 미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었던 상대성이론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지동성이 행성의 운동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왜냐하는 마찬가지로 행성은 원운동을 해야 했으며, 빛이 직선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두 패러다임의 차이는 질의 차이가 아니라 양의 차이였다. 뭔 얘긴고 하니 잘 맞지 않는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니 주전원 - 즉 행성운동은 원운동을 하는 또 다른 원의 궤도 - 도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주전원은 천동설은 물론 지동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 둘의 주전원의 숫자일 뿐이었다. 천동설이 좀 더 많은 주전원을 도입해야만 행성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캄의 면도날이 주는 교훈은 '자연을 설명하는 두 가지 설명방식이 있을 때 좀 더 간단한 것이 진리다.' 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동설이 승리하며 행성운동의 패러다임은 바뀌게 된다.
홉스로부터 시작된 경험주의 인식론도 오캄의 면도날을 비켜갈 수 없었다. 경험주의는 나의 밖의 대상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것을 '실체'라고 부르진 않았다. 그렇게 되면 합리론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크는 그것은 '알 수 없는 것' 이라고 한다. 뭐라고 하긴해야되는데 실체란 말을 죽어도 쓰고 싶지 않았던 게다. 하지만 '버클리의 면도날'은 그 '알 수 없는 것'도 없애 버린다. 이제 남은 것은 감각의 다발 뿐이다. 이래서 경험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나의 외부에 대상으로서 실재하는 것을 전제로한 경험론이 그 실재를 없애 버린 것이다. 게다가 '흄의 면도날'은 이성을 잃어버렸다. 나 밖의 대상도 모자라서 자아, 그리고 인과율을 없애 버린다. 이제 아무것도 남질 않았다. 이렇듯 면도날은 무자비한 것이다.
오캄의 면도날의 '불필요한 실재를 덧붙이지 말아라'란 교훈을 너무 철저하게 지킨탓이다. 흄의 결론은 경험론이 도달할 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론이었던 것이다. 흄은 너무도 순박하여 무시무시한 흉기를 멋모르고 휘둘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칸트로 하여금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던 것이다.
------------------------------------------------------------------------------------------------------------------
중세 철학의 일반적인 원리인, 오캄의 면도날(Occam's Razor)은, 오캄의 윌리엄(William of Ockham, ca.1285-1349)이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된것입니다.
오캄의 면도날은 '복잡한 의견을 불필요로 하는 원리(the principle of unnecessaty plurality)', 혹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언명(言明)을 제시해서는 안된다' (plurality should not be posited without necessity)는 원리인데요,
현대에서는 '설명은 단순한 것일수록 뛰어나다', '불필요한 가정을 늘이지 마라'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캄의 면도날은 단순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simplicity)라고도 불려집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