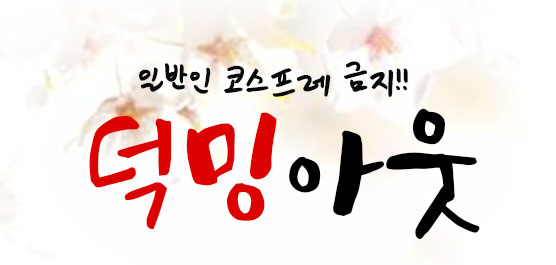오행의 성격
오상五常은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떳떳한 도리道理나 덕목德目을 뜻한다. 바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오상五常이라 한다. 삼강오륜과 함께 유교 윤리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데, 한대漢代에 이르러서 동중서董仲舒라는 사람이 이전에 맹자가 주창한 인仁·의義·예禮·지智에 신信을 포함시켜 인간이 항상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기본덕목으로 설說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러한 오상五常도 양생법의 관점에서는 오성五性의 생리로서 심리상의 도덕(仁義禮智信)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하여 국선도의 청산선사께서는 “수도를 깊게 하면 할수록 자연히 심성心性이 변하여 오성의 실행實行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가르쳐서 또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함에 따라 자연히 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오상五常을 오행五行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仁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작용인 목木에 해당한다. 목木은 베풀어 모든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주관한다. 그리하여 봄의 상징은 하늘이 사랑을 베풀어 봄에는 모든 만물의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다. 인仁은 인자함이나 자비를 베푼다는 뜻인데, 그것은 생명을 소생시키고 탄생시키는 덕이다.
예禮는 위로 치솟으며 타오르는 불의 작용인 화火에 해당한다. 만물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여름의 화火는 성장과 발전을 주관하여 모든 사물이 질서를 유지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火는 문명을 나타내며 밝음을 상징한다. 하늘에 떠있는 일월과 같이 세상을 훤히 비추어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처리하는 예禮와 같다. 항시 밝은 상태를 유지해 자신을 비추어보고 예절로써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 확실히 표현한다.
신信은 건실한 흙의 작용인 토土에 해당한다. 사계절이 성실하게 운행되도록 하는 토土는 후덕하고 묵묵한 흙의 형상으로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며 목화금수木火金水를 주관하여 믿음과 성실, 신용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근본이며 조화의 상징이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믿음과 신용을 보여준다. 오행五行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각기 계절의 끝에 붙어 있으면서 오행五行 상호간을 조화로써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土며, 한 계절이 지나갈 때면 반드시 다음 계절을 맺어주는 신용을 지킨다. 모든 만물은 이와 같이 믿음과 신용으로 서로 의지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이것이 파괴될 때는 불신과 배신과 사기가 일어나며 질서가 파괴되어 모든 분야에서 파멸이 오게 된다.
의義는 만물을 서늘하게 하고 쪼그라들게 하는 쇠의 작용인 금金에 해당한다. 만물의 결실을 맺게 하는 가을은 오행 중 금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금왕지절金旺之節이라고 한다.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는 살벌殺伐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 이것이 바로 금金이다.
<적천수適天髓>에서는 가을을 숙살지기肅殺之氣라고 하고,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는 종혁從革이라고 했다. 금金은 단단하지만 외부의 충격이나 힘에 의해 모습을 바꾼다는 뜻으로,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시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되는 의리義理야말로 금金이 말하는 덕목德目이다. 나라에서 범죄인을 다스릴 때 여는 것이 추국청推鞫廳인데, 이때의 ‘추’가 바로 가을의 숙살지기肅殺之氣이다. 그러므로 가을金은 모든 것이 열매 맺는 시점에서 추살과 불의를 냉정하게 처벌하는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지智는 속을 잘 감추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물의 작용인 수水에 해당한다. 겨울 운동의 시작은 가을의 살벌한 심판이 끝나갈 무렵에 땅에 떨어진 것을 밑으로 가두고 응고 시키려는 활동에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상징하며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루어 동면에 들어가서 통일과 수렴을 주관한다. 지智가 수水와 닮은 점이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것을 ‘도道’라고도 말한다. 그러므로 겨울은 만물의 씨앗을 잘 감춰서 다음해의 봄(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담는 그릇에 따라 그 형상形象이 달라지는 유연한 자세와 안으로 내실을 다져 씨앗(子)처럼 단단하게 응고시키는 능력이야말로 수水가 말하는 지혜를 구하는 자세이며 덕목德目일 것이다.
Comments